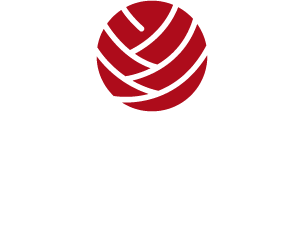- 여명 1호, 여명사, 1925. 7
- 죽순, 대동서원(죽순시인구락부), 1945. 5 ~ 1949. 7
- 아동, 태평출판사, 1946. 4 ~ 1948. 7
- 대낮, 교문사, 1948, 기증자 신지용
- 귀환장정, 수도문화사, 1951
- 전선문학, 대건인쇄소, 1952. 4 ~ 1953. 12
- 씨뿌린 사람들, 사조사, 1959
-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 낙강, 문화출판사, 1967
- 타령조・기타, 문화출판사, 1969
- 엽사전, 형설출판사, 1969
- 산문산책, 형설출판사, 1972
- 별들의 합창, 아인각, 1966
- 별똥, 보성문화사, 1971
- 해, 교문사,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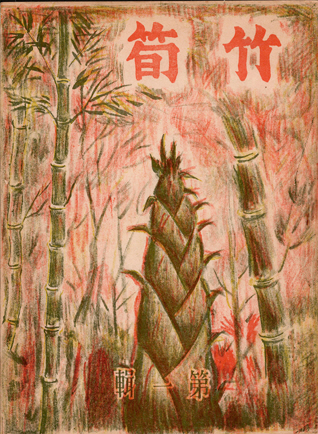
Daegu Literature Museum
죽순, 대동서원(죽순시인구락부),
1945. 5 ~ 1949. 7
이윤수는 대구 출생으로 1935년 일본 와세다대학 상과를 졸업하고 일본시단에 「청언의 노래」를 발표한 후 본격적인 문학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구로 돌아와 운영한 시계방은 문학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 직후 최초의 시동인지 『죽순』을 간행하였다. 시계방 '명금당'과 『죽순』은 이윤수의 대명사이자 향토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또한 그는 1948년 달성공원의 상화시비 건립과 1985년 '상화시인상'을 제정하여 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죽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에 창간하여 1949년 7월까지 임시증간호를 포함 12권이 발행 되었다. 재정과 용지난으로 인해 잠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79년 1월 죽순 창간 30주년을 기념하는 복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월간으로서 죽순이 발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발행된 까닭에 지역의 많은 문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창간호에는 유치환, 오란숙, 박목월, 이호우, 김동사등 17명의 동인들이 시를 발표 했으며 발간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호를 거듭할수록 작품을 발표하는 동인이 전국규모로 늘어나 60여명의 시인들이 235편의 작품을발표 하였다. 그 가운데는 김달진, 박두진, 조지훈, 김상옥, 윤곤강, 이상로, 조연현, 구상, 조영암, 서정태, 설창수, 신동집, 이영도, 김춘수, 박화목 같은 작가들이 작품을 실었다. 추천을 통해서 김요섭, 윤운강, 김춘수, 천상병 같은 신인들이 문단에 나왔다. 이처럼 『죽순』은 해방된 문단의 시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죽순』 창간호의 편집후기에는 '눈이 나리여 덮힌 대숲에서 왕대의 꿈을 안고 솟아오르는 어린 죽순 하나가 이제껏 부르지 못한 노래를 하늘이 베푼 이 땅의 해방과 함께 불러볼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죽순이다.'라는 말로 죽순 발간의 포부를 전하고 있다. 9집에서는 '한기가 자꾸 몸에 쓰며 오며 오는 한방에서 아직은 잠들어 있는 어린 놈들의 얼굴을 안고 붓을 맺는다'고 밝히며, 각 호를 거듭할수록 재정과 용지난 등 말로 다 할수 없는 어려움들을 토로 하고 있다.
대구문학관에서 해방이후 1946년 5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발간된 12호를 만나볼 수 있다.